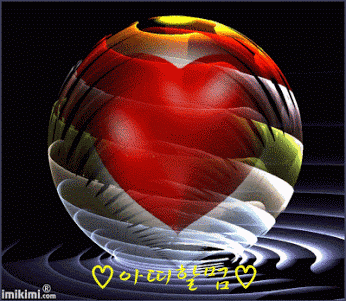[김창균 칼럼] 윤석열 캠프에서 김칫국 냄새가 진동한다 김종인·이준석과 감정 싸움 그는 “주접을 떤다”는 심한 말을 퍼부으며 윤석열 캠프에 등을 돌렸다. 마찬가지다. 의견이 분분했다. 난 것만큼은 분명하다. 윤 후보 자신이었다. 투톱은 캠프에 무슨 보탬이 될지도 설명이 안 된다. 속했던 김종인 카드를 어떻게든 손에 쥐고 싶었을 것이다. 버겁고 골치 아픈 상전을 내치는 쪽으로 마음을 고쳐 먹은 듯하다. 집안 대사를 앞두고 가족 전체가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는데 장남이 “내 밥상 누가 치웠냐”고 어깃장 놓는 모양새다. 앞세웠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윤 후보 쪽에도 있다. 것을 비롯해서 ‘이준석 패싱’을 의심할 만한 일들을 벌여 왔다. 윤 후보 측은 이준석 대표를 ‘버릇없는 어린 것’ 취급하며 길들이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인사가 “나도 30대 아들이 있다”며 당대표를 애 취급하는 것이 그런 정서를 대변한다.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늙고 낡은 야당에 새바람을 몰고 왔다. 윤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는 절실한 심정이었다면, 그래서 이 대표를 자신의 취약 포인트인 젊은 층 공략에 도움을 줄 소중한 자산으로 여겼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치고받느라 바쁘다. 칼을 꽂는다. 대선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착각하고, 전리품을 서로 챙기느라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상황 인식이 드러난다. 담겨야 한다. 미국 대선 후보는 배경과 성향 면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러닝메이트를 고른다. 포용력과 유연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어떻게든 선거는 이길 것이라는 방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후보 개인 경쟁력 덕분이 아니다. 운동장이 윤 후보가 골을 넣기 쉽게 기울었기 때문이다. 유지 여론에 앞서고 있다. 여당은 텃밭인 호남 인구가 영남의 절반에 못 미치는 핸디캡을 극복하려면 수도권에서 적어도 5%p이상 우세를 점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 때문에 서울 민심은 야당 쪽으로 기울었고, 이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마저 백중세다.
20대가 보수색을 띠면서 세대별 구도도 야당에 유리한 편이다. 주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돌아 다닌다.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서서 심판을 준비한다. 놓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냄새가 사방에 진동한다. 받은 카톡칼럼 편집입니다! 2021.12.2.아띠할멈.(). http://blog.daum.net/jamyung820 |